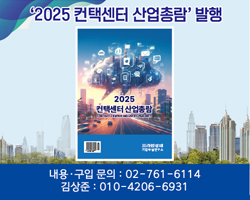'찬밥 신세' 스팩, 증권사 찍어내기식에 '시장 포화'
올해 1분기 상장 철회 5곳…지난해 건수 이미 상회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4.12 10:26:47

서울 여의도에 증권사가 밀집해 있다. ⓒ 연합뉴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스팩8호는 지난 6일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4일과 5일 수요예측을 진행 후 이달 10일 일반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당초 공모규모는 120억원이었다.
회사 측은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최근 공모 시장의 제반 여건을 포함해 투자자 보호 사항 등을 고려 시 공모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상장을 추진하다 철회한 스팩은 총 5곳이다. 앞서 KB스팩24호(공모규모 400억원), NH스팩29호(255억원), 유안타스팩11호(150억원), 키움스팩8호(130억원)도 상장을 철회했다. 이는 △2020년 4곳 △2021년 2곳 △2022년 4곳 등과 비교하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건수를 넘어선 수준이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국내에는 2009년에 처음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진했던 IPO(기업공개) 시장의 대체재로서 스팩이 주목받았다. 안정된 수익률과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지난해 '스팩 열풍'의 주도자는 증권사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신규 상장 스팩은 45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9곳, 24곳이 상장됐다.
하지만 증권사의 찍어내기식 스팩 상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됐다. 증권사들이 수익률에 매몰돼 앞다퉈 스팩을 상장시키면서 증권사 스스로 스팩 시장을 포화 상태로 만든 셈이라는 평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스팩합병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팩 상장 건수 급증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증권사의 스팩합병 악용 가능성도 살펴본다. 스팩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스팩 취득단가가 일반 투자자의 절반 수준이고, 합병 성공 조건부 수수료도 취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게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발기인 견제 부족 현상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스팩 합병 시 증권신고서에 투자 주체간 이해상충 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 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경고까지 더해지면서 스팩의 인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이 인기를 중소형 직상장사들이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상장한 코스닥 상장사 17곳 중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 형성 후 상한가)'을 성공한 종목은 4곳에 달한다.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100%를 넘긴 상장사도 10곳이다.
전문가들은 스팩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으면서 추가 상장이 아닌 합병 대상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쉽게 말해 증권사가 상장된 스팩부터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대기 중인 상장 스팩이 상당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추가 스팩 상장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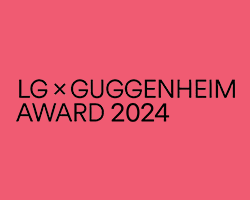







![[포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국립암센터에 3800만원 기부](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207/art_674424_1739406388_245x1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