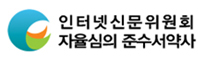[김재현의 스포츠세상] 한국부모에게 어린 운동선수의 꿈은 중요치 않다?
미국 유소년선수들, 학업 병행 없인 진학 불가능…제2 인생 위해 반드시 필요
[프라임경제] 중·고등학교 시절의 운동부 친구들을 떠올리면 늘 비슷한 이미지다. 주로 운동복 차림에 수업시간엔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점심시간 후부터는 운동장이나 기숙사에서 운동을 하며 일상을 보냈던 모습. 또 교내활동에서 운동부 학생들은 늘 열외였고, 가끔 학우들과 수업일정을 보낼 땐 아주 간만에 친구를 만난 양, 어색하기도 한 그런 식이었다.
운동부 학생들은 공부와는 거의 담을 쌓고 지냈기 때문에, 공부에 지친 또래의 부러움을 샀고, 시험 때면 대충 찍어(?) 놓고선 버젓이 잠을 청하는 모습이 무슨 특권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공부와 운동 둘 중 운동을 선택한 터라 운동이 최우선이었다. 반면, 공부는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유가 되면 관심을 가져볼만한 그 정도의 수준 밖에 안됐다.
이 운동부 친구들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뤘을까.
필자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야구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접했다. 미국에서 야구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으로 손꼽히는 캘리포니아 LA 야구선수양성프로그램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와는 사뭇 다른 이들의 환경에 적잖이 놀랐다.
이곳에선 비교적 이른 나이인 5~6세에 야구를 시작하는데, 유소년들이 지역사회나 자치단체 등을 통해 야구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야구계 입문이 이뤄지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유소년들이 이 시기에 야구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를 병행해 익힌다는 점이다. 여러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기는 중에 자신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룰의 중요성을 익히는 것이다. 유소년 스포츠가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방식이다.
야구 선수 스카우트 스타일도 달랐다. 한국의 야구선수들은 대개 초등학교 야구부에서부터 출발한다. 초?중?고교 야구부를 거쳐 대학팀이나 실업팀, 프로팀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고등학교에 마련된 운동부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야구를 배우기 시작한다. 유소년과 중학생 시절엔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는 동시에 반드시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운동 종목에 대한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히면서, 학습과 교양 습득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다.
△Varsity(우리나라 교육체계로는 중3부터 고3) △Junior Varsity(고2부터 고1) △Sophomore와 Freshman(고1부터 중3)으로 나뉘는 미국의 학년 체계에선, 기본적으로 G.P.A.(Grade Point Average) 2.0 학점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운동부를 탈퇴해야 하는 엄격한 시스템이 가동된다. 수업면제특권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운동시합과 운동연습은 수업을 마친 후에 진행된다. 수업시간을 빼먹고 시험을 망쳐도 당연시 여기던 종전의 우리나라 학교운동부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판이다.
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도 다른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전국고교야구대회나 학교간 시합 중에 대학팀에 스카우트 되는 식이지만, 미국은 학생들이 고등학생 때 스스로 자신의 시즌기록과 프로필을 관리해 진학 전선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스카우트들이 와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신이 지낼 만 한 곳을 찾아나서는 게 보편화 돼 있다. 따라서 유명 대학팀으로 가려면, 당연히 그만한 학업성적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는 운동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선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설령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떡잎'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학생으로서의 학습 습득 과정은 꼭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사회는 어린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엄청난 공을 들인다. '서든캘리포니아대학교(USC) 존 맥케이 센터'에서는 교수들이 21개 종목 650명의 선수 모두를 대상으로 1대 1 전문 카운슬링을 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최상의 적합 종목을 찾아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시스템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미국은 '스포츠 학생'을 대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학생들은 스포츠를 접할 때 일단 '즐기기'로 시작한 다음, 다양한 선택의 폭을 놓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한다. 학업은 당연히 학교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일반학생과 똑같이 해야 한다. 소수만이 살아남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길을 달리하는 바람에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없게 된다면 선수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포츠선수 생활을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살 때 자신의 특기종목을 물론, 유년시절부터 익혀온 다양한 스포츠지식과 경험은 스포츠 교육자의 길로 접어드는 데 매우 용이하다. 설령 스포츠 교육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운동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배려하는 시스템이 미국엔 뿌리 깊게 내려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유년시절부터 오직 한 가지 운동에 몰두해온 학생 스포츠선수가 국가대표나 프로선수가 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이 선수의 미래는 어둡게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특히 학생신분이었을 때 놓쳐버렸던 학업 기회를 다시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낙오자' 기분마저 들 수도 있다.
근래 들어 덕수고 3학년 이정호 군의 기사를 매우 반갑게 접한 적이 있다. 야구와 학업을 병행하며 서울대 수시 지원자격인 4등급으로 당당히 합격한 내용이다. 이군은 "서울대 출신 1호 프로야구선수가 선수로써의 목적이고 그 다음은 야구행정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피력했다. 자신의 스포츠 인생 설계를 너무도 성실히 잘 그리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필자는 10여년간 스포츠현장에서 유소년 축구교실과 체육활동을 지도하며 아이들의 면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런 중에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접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꿈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본인들의 꿈을 아이들이 실현해주길 간절히 원했고, 이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성적과 기록, 성장과 재능에만 집중돼 있었다. 학생들의 내신점수와 수능점수에 목을 매는 많은 부모들의 '열정적 극성'과 다를 바 없었다. 이 같은 왜곡된 주변의 기대와 1등 중심의 스포츠 환경 속에선 학생선수들이 부상을 입기 쉽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1등 경쟁'에 매몰 된 스포츠 양성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은 쉽게 꿈을 잃고 만다.
공부를 통한 인성, 공부를 통한 친구, 공부를 통한 인생설계 등의 '공부 네트워크'를 우리 어린 선수들이 꼭 가슴과 머리에 담았으면 한다.
 |
||
김재현 스포츠칼럼니스트 / 체육학 박사 / 문화레저스포츠마케터 / 저서 <붉은악마 그 60년의 역사> <프로배구 마케팅> 외 / 서강대·경기대·서울과학기술대 등 강의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