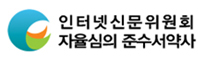[김재현의 스포츠세상] '감독 수난시대' 구단의 책임 떠넘기기 '이제 그만'
야구·축구·농구 유명감독들 줄줄이 사퇴… 구단 눈엔 '오로지 성적' 기다림·소통 실종
[프라임경제] 지난해 11월부터 불어닥친 혹독한 한파는 겨울나기를 유달리 힘들게 했다. 그런데 국내 프로스포츠계에는 지난해 한여름부터 겨울한파 버금가는 모진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지난해 8월말 한화이글스 한대화 감독의 전격 경질에 이어 넥센 김시진 감독의 경질 소식이 날아들었다. 프로야구 8개 구단은 최근 2년새 감독을 전원 교체하는 등 마치 물갈이 붐이라도 인 듯 보였다.
프로축구는 이보다 몇 달 앞선 4월에 인천의 허정무 감독이, 7월엔 강원 FC 김상호 감독, 8월 전남 정해성 감독이 연이어 감독직을 내놓았다. 또 12월엔 성남의 신태용 감독이 자진사퇴했다. 신 감독은 2009년 성남FC에 감독으로 부임해 그해 K리그 준우승, 이듬해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011년 FA컵 우승을 이끌어 선수와 지도자로서 모두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최초로 이끈 성남구단의 자타공인 '레전드'였기에 팬들은 물론, 스포츠 관계자들의 충격이 컸다.
추운 겨울을 뜨거운 스포츠 열기로 채워주는 프로배구 V리그에도 지난 2월 찬바람이 모질게 불었다. 배구계가 지난 설날을 전후해 전에 없던 '공포의 계절'을 겪었는데, 남자프로배구에서 3명의 감독이 같은 시기에 팀을 떠난 것이다. 대한항공 신영철 감독이 2월9일, KEPCO 신춘삼 감독이 2월10일, LIG손해보험 이경석 감독이 2월14일 줄지어 경질되면서 K리그 남자배구는 한주 동안 3명의 감독이 교체되거나 부재 상황인채로 시즌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일련의 감독 교체 사태를 지켜보면서 '감독 자리가 갈수록 파리 목숨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일단, 팀의 성적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성적이 떨어지면 일단 책임의 화살은 먼저 감독을 향한다. 감독이 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감독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구단의 운영방침 때문에 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포츠 생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프로구단 사무국의 독선적인 구단 운영과 이에 호락호락하게 응대하지 않는 구단 감독간의 갈등…. 이런 상황에선 십중팔구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프로팀은 당연히 성적․실적이 중요하다. 프로에겐 그 무엇보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감독 한 명의 것이 아니다. 선수, 팬, 그리고 구단, 이 3자가 신뢰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산물이다. 물론 그 중심에 서 있는 감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그만큼 책임도 크다. 이는 모든 스포츠 감독들도 공감할만한 이치다. 그렇지만 팀의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독에게 묻는 풍토, 그리고 감독만 경질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일을 진행하는 것은 다분히 책임을 어딘가에 전가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마치 구단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감독 탓'이라고 뭔가를 다 떠넘기려는 것 같다.
기존 감독의 빈자리를 채운 신임감독이 당장에 좋은 성적을 냈다하더라도 이 신임감독의 마음은 과연 편할까. 선후배 관계가 끈끈하기로 유명한 스포츠계에서 감독들은 치열한 경쟁관계로 숱하게 내몰린다. 스포츠정신의 파인플레이보다 생존의 게임을 벌여야 할 판이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조장하는 주체는 대개의 경우 구단이다. 신임감독으로 하여금 언제 어떻게 '팽 당할지'에 대한 걱정을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고착화 된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어떤 곳이든 간에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뭉쳐있는 탄탄한 조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스포츠는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텝 그리고 선수 간의 팀플레이가 생명이다. 선수들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리더를 신뢰하고 리더의 지시․명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 극도의 에너지가 뿜어 나온다. 우리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스포츠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뭉쳤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신화는 '0-5'에서 시작했다.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0-5' 패를 당하면서 '오대영'이라는 치욕스러운 별칭까지 얻었던 히딩크 감독. 그는 미디어의 거센 비난과 의혹 제기, 그리고 한국 축구계의 숱한 압박에도 결코 동요하지 않았다. 과정에 대한 신념으로 팀을 끝까지 이끌었다. 특히 박지성과 송종국을 대표팀 명단에 올렸을 때 축구협회와 일부 주요 미디어는 히딩크 감독을 심하게 질타했지만 그는 결코 밀리지 않았다. 그리곤 마침내 한국형 조직력의 힘을 보여줬다.
실패가 더러 있었지만 이는 팀을 성장 시키는 과정이었다. 시도와 착오 속에서 오류를 좁혀가며 더욱 강화된 팀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감독과 선수, 그리고 구단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소통과 신뢰를 더해갔다.
스포츠 세계에서 신뢰는 한 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다. 프로감독의 3년 계약의 의미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감독 자신이 소신을 가지고 원하는 팀을 만들어가고 지도자 특유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감독의 지도력과 그때그때 경기마다 나오는 팀플레이 지시와 선수들의 플레이에 관중은 응원과 열광을 보낸다.
△구단과의 마찰에 따른 선수 능력의 저하 △부상과 결장에 따른 팀플레이의 난항 △개인적 고충에 따른 선수 컨디션 문제 등을 극복해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오랫동안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해온 감독의 존재다.
구단이 감독을 진정으로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감독이 그동안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감독으로 하여금 선수들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했는지 △성공을 위한 전단계인 '시도의 과정'을 제대로 지원했는지 등을 차례차례 점검해 보길 바란다. 한 시즌의 실패는 다음 시즌의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승리와 우승에 대한 열망은 구단과 선수, 감독 모두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감독이 더 강하면 강했지 결코 덜하진 않을 것이다.
봄이 성큼 왔다. 국내 프로스포츠가 2013년 새 시즌을 맞는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국내 스포츠계에도 한파가 아닌 훈풍이 불길 바란다.
스포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즌성적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정신에 있고, 스포츠의 '과정'을 인정할 때 스포츠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구단은 물론 많은 팬들 마음에 깊이 자리하길 바란다.
 |
||
김재현 스포츠칼럼니스트 / 체육학 박사 / 문화레저스포츠마케터 / 저서 <붉은악마 그 60년의 역사> <프로배구 마케팅> 외 / 서강대·경기대·서울과학기술대 등 강의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