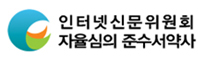[프라임경제]'시니따이? 고로스요!’
“우리는 친한 사이에 농담하듯이,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죽을래? 죽여버리겠어!’라는 말을 달고 산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어쩌다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서로가 해석, 긴장한다. 일본에서는 가장 쎈 말이 빠가야로 정도”라는 말을 일본에서 살다 온 지인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
||
| ▲ OLYMPUS DIGITAL CAMERA | ||
들었을 뿐이지 직접 보거나 겪은 것도 없으면서 필자는 평소 일본에 대해 거의 다 알고 있다고 그냥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 발도 안 디뎌 봤다. 일제 잔재로 우리말에 섞여있는 ‘다깡, 덴뿌라, 히끼, 오시’ 같은 단어 말고는 일어도 모른다. 일본 사람과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 물론 말이 안 통하니 만났던들 소통할 수도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니 사실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결론만 그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역사 시간에 배운 일제 36년의 악행과 주기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욱!’할 뿐이다.
1944년 6월 2차 대전 막바지에 미국도 그랬다. 전체 병력의 25% 정도가 전사에 이를 정도면 전투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 당연한 유럽의 문화와 달리 17,300 명 중 17,150명의 군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나라. 포로로 잡힌 150명 마저 전투 불가능한 부상자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수치로 여겨 자살하는 사람들.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항공모함으로 돌진하는 무서운 조종사들. 미국으로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였다. 일본은 본토사수를 외쳤고, 이를 무력으로 점령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치를 지 알 수 없는 상황. 미국 전시정보국은 당대 최고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에게 이런 일본인의 속성에 대한 연구를 급하게 의뢰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일본을 해부한 불후의 고전이라는 ‘국화와 칼’이다.
대개 책 제목을 먼저 달고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이 완성되면 그것을 고강도로 압축한 단어가 제목이 된다. 국화와 칼, 그 제목이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웃 나라 왕비를 난도질했던 사무라이의 칼과 국화를 사랑하는 탐미적 심성,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약자는 철저하게 밟는 ‘강비약밟’, 오만방자와 끝없는 겸손함, 죽창 들고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지휘자가 죽으면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유럽을 배우고 발전했음에도 인간을 신으로 신봉하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극단적 이중성의 나라와 국민이 일본]이라는 결론 아래 미국의 종전 전략도 수립되었을 것이다.
결국 에놀라게이에 실린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때리면서 ‘천황의 도쿄’를 압박해 항복을 받아냈고, ‘오야붕’이 항복하자 순식간에 ‘서양인 쇼군’ 맥아더에게 순종하는 일본인에 대해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들도 적잖이 의아스러워 했다. 물론 기왕에 개발한 가공할 위력의 원자폭탄을 과시할 테스트 마켓이 필요했던 미국이 같은 핏줄인 유럽 대신 황색의 일본을 택했다 ‘카더라’는 뒷담화도 있긴 하지만.
책이 나온 지 벌써 70 년이 다 돼 간다. 강산이 일곱 번이나 변했을 기간이라 일본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핏속의 기본 속성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을뿐더러 현재를 알기 위해 과거를 알아보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당시의 동양적 생활상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일본에 대해 서양의 엘리트 인류학자가 바라보고, 번역하는 관점과 단어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그 비슷한 점들이 일제 36년 거치면서 생겼는지 같은 문화권이라 그랬는지, 지금의 일본은 그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등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도 태산이다. 이 모든 게 귀찮으면 이원복 교수의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이라도 비 오는 일요일에 봤으면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독도’를 지키는 것은 센카쿠 열도를 희토류로 단칼에 무릎 꿇리는 중국 같은 ‘힘’과 고려대 김현구 교수처럼 개인 돈 써가면서도 끈질긴 학문적 연구 [임나일본부 설은 허구인가]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꼬치꼬치 깨부수는 ‘실질’이지 결단코 ‘욱!’은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이 ‘국화와 칼’의 결론이다.
 |
||
컬럼니스트 최보기 thebex@hanmail.net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