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9곳 "우리의 꿈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확대 요구…기관 투자 가뭄 해결책 '전용 펀드' 조성 제안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5.12.15 09:30:08
[프라임경제] 코스닥 시장의 침체 우려에도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짝사랑'은 여전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대다수가 여전히 최우선 상장 목표지로 코스닥을 꼽았다. 다만 이들의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지난 12일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및 벤처기업 의견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 대표 및 임원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자금조달엔 역시 코스닥" 기술특례 선호 뚜렷
조사 결과에 따르면 IPO(기업공개)를 계획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85%가 상장 희망 시장으로 코스닥을 선택했다. 코스닥이 여전히 벤처 생태계의 핵심 자금줄이자 성장의 사다리임이 입증된 셈이다.
상장 방식에 대한 선호도 뚜렷했다. 응답 기업의 61.8%가 '기술특례상장(기술성·성장성)'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일반상장(35.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길 원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상장 희망 기업의 90% 이상은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효과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 중 벤처기업의 비중도 이를 뒷받침한다. 11월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39%인 625개사가 벤처기업이다. 최근 1년간 신규 상장한 기업 중에서는 77%가 벤처기업이었다. 사실상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의 신규 진입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 '형님'만 잘나가는 시장 상대적 박탈감 커져
벤처기업들의 열망과 달리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코스피 시장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지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4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코스닥은 같은 기간 22% 상승에 그쳤다. 시가총액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5년 전 대비 코스피 시총이 47% 불어나는 동안 코스닥은 9% 성장에 머물렀다. 코스피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수급 불균형도 벤처기업들의 고민거리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65%에 달한다. 기관 및 법인(31%)의 참여가 저조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평가다.
◆ "기술평가 개선하고 펀드 만들어달라"
벤처업계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과 '자금 공급'을 꼽았다.
설문 결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등 제도 개선(51.8%)'이 꼽혔다. '정책펀드 등 자금공급 확대(50.9%)'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특례상장의 실적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본래 취지에 맞게 당장의 매출보다는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해달라는 주문이다.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할 당근책도 제시됐다. 협회는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연기금 등 67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코스피·코스닥 지수 변화. ⓒ 벤처기업협회
세제 혜택 카드도 꺼내 들었다. 2006년 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의 재도입이다. 준비금을 적립해 법인세 혜택을 받고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가 많고 이익 변동성이 큰 기술 벤처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도 약속했다. 응답 기업의 84%가 부실기업 퇴출 요건 강화에 찬성했다. 진입 장벽은 낮추되, 좀비기업은 과감히 솎아내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가 조성돼야 시장 신뢰가 회복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들에게 코스닥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며 "건실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수 3000 시대도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 차원의 '코스닥 3000'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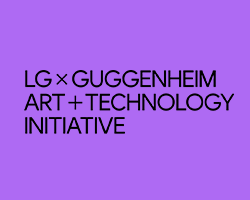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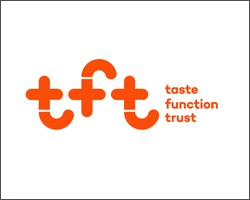















![[포토]](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1250/art_716010_1765500157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