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요즘 카드산업을 두고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카드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판매 수익이 점점 줄고 있어서다. 지난해의 경우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밑돌기까지 했다.
본업의 빈자리는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이 메웠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 총 수익 1조4304억원 가운데 카드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 대출 상품 의존도가 커진 만큼, 건전성 저하도 불가피했다.
그 여파는 소비자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우선 혜택이 줄었다. 대표적인 카드 혜택인 '무이자 할부'가 부활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였던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문턱도 금리가 15%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카드대란'을 떠올린다. 먼저 그 시발점이 연체율 상승이었다는 점에서 현 상황과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5%를 기록했다. 카드 대란 당시 최고치인 4.1%와 불과 0.6%포인트 차이다.
원인 역시 유사하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규제 완화를 택하면서 카드사 간 영업 경쟁이 과열됐고, 그때까지 신용카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소비자들은 이를 가감없이 받아들였다. 무분별한 현금서비스 사용에 빚에 쫓기던 소비자들은 다른 카드로 이를 갚아나가는 '돌려막기'에 빠졌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카드사들의 연체율도 나날이 낮아져 갔다.
대응마저 닮았다. 카드대란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론 규제와 대출 한도 제한에 나섰지만, 뒤늦은 조치였다. 결국 BC카드를 제외한 주요 카드사 대부분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현재도 연체율이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카드론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
그렇다면 당시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정부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는 △가맹점 수수료 면제 중단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자율화 △무이자 할부 중단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카드사 부실채권 매입 등이 포함됐다. 카드사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자금 조달 지원이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일종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금융권 생태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 사이클이 카드산업에서 다시 작동하려고 한다. 해답을 찾기 위해 과거를 들여다볼 때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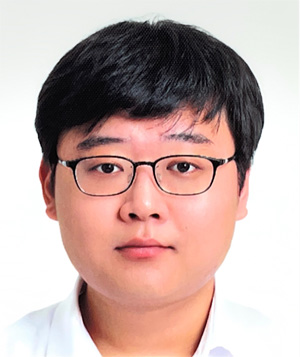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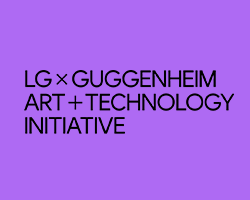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포토] 낚시·콘텐츠 만남, 히트업 '피싱클럽 팝업' 오픈](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623/art_691015_1748831581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