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건설업계 허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균형 위한 처방 필요" vs "무분별한 사업 부작용, 업계 조정 시급"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04.14 17:54:08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그야말로 '건설업계 허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건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업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가 존폐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공사비와 미분양 물량 확대로 인해 법정관리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건설사 리스크 분석 자료(11일 기준)'에 따르면, 시공능력순위 100위권 내 부실 징후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4곳 늘어난 15곳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건설사 부실 징후 여부와 관련해 △영업적자(수익성 0% 미만) △부채 과중(비율 400% 초과) △순차입금 과중(의존도 40% 초과) △매출채권 과중 등으로 평가한다.
지난 2022년 당시 2곳에 불과한 '시공능력 31~100위 부실 징후 건설사'는 △2023년 7곳 △2024년 10곳 △2025년 14곳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 징후 건설사들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경우 PF 우발채무까지 더해지면서 진퇴양난에 놓인 상태다.
실제 지난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규모는 △수도권 1만7600호 △비수도권 5만2467호 총 7만61호에 달한다. 이중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체 33.7%이지만, 비수도권에만 80.8% 가량 집중됐다는 게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 징후 건설사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 비중이 높은 건설사"라며 "실제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도급 비중이 62.2%인 반면, 중견 또는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많아야 50%도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위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나름 입지를 확보한 지역 건설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충북 1위' 대흥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공시한 데 이어 '경남 2위' 대전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주택 시장 양극화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사 부실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지방 부동산 문제를 해선 정부 차원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서울·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며 "더 늦기 전에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 종합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업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전후 다수 건설사들이 업계 호황에 힘입어 무분별하게 감행한 사업 확장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부실 건설사는 물론, 부실 사업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전후 주택 사업 호황으로 인해 2021년 당시 9만여곳에서 2023년에는 10만여곳까지 우후죽순 건설사들이 늘어나기도 했다"라며 "경기 불황 때문에 역사가 있는 업체들도 쇠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차라리 '옥석 가리기'를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과연 존폐 위기에 내몰린 중소·중견 건설사들에 대해 정부의 대응과 업계 내부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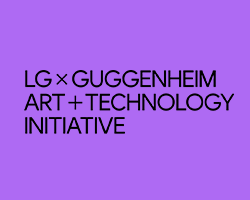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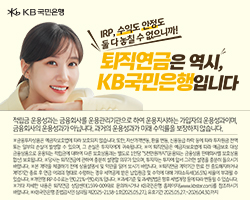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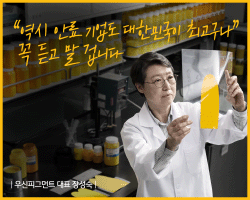



![[포토] 낚시·콘텐츠 만남, 히트업 '피싱클럽 팝업' 오픈](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623/art_691015_1748831581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