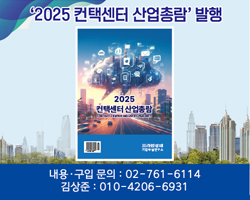[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법원 판례'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narae.kim@dlglaw.co.kr |
2025.03.06 17:39:39
[프라임경제]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특허법원에서 13가 폐렴구균 백신(이하 '대상제품') 특허를 둘러싼 글로벌 제약사인 A사와 국내 제약사인 B사 간 소송의 2심 판결(이하 '본건 판례')을 선고해 그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 관련사건 B사는 2017년 경 13가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국내에서 등록된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B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B사는 위 백신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상태이다. |
◆ 직접침해 부정: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미친다.
관련해 과거 대법원은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해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만이 생산된 경우에도 그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한 경우, 해당 실시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국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이다.
A사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B사가 대상제품의 원액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했고, 이를 단순 혼합하면 대상제품이 완성되므로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대상제품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을 단순 조립으로 볼 수 없고, 비율, pH, 온도, 교반속도, 순서 등 다양한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즉, 대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직접침해를 부정한 것이다.
◆ 간접침해 부정
A사는 대상제품의 원액이 다른 대상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해외로 수출해 대상제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행위는 특허법상 간접침해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대상제품의 원액은 연구 또는 대상제품 외의 다른 백신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고, 대상제품 생산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침해 역시 부정했다.
◆ 연구목적 실시의 예외 인정
B사는 대상제품의 원액을 임상시험 목적으로 수출했으므로, 특허법상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항변했다.
특허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원액이 연구 및 시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사항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시사점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을 고려해 연구개발을 진행할 때, 국내에서의 특허 침해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목적 실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실제 연구 과정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제품을 최종 완성하는 경우에도 국내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술 수출이나 글로벌 연구 협력을 계획할 때 그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 박사 졸업/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 박사 졸업/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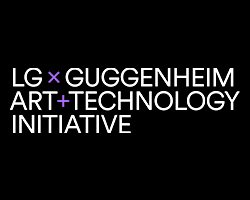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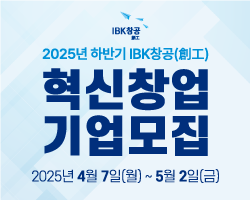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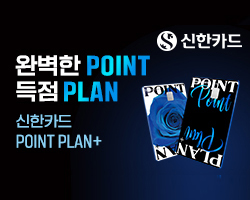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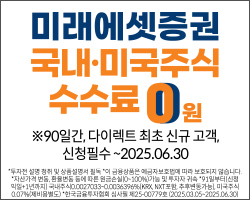


![[포토] 1년 만에 재개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684642_1745195174_245x1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