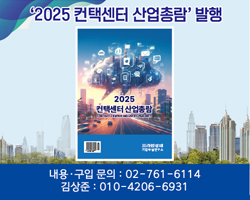[프라임경제] "일각에서 실손보험 개혁이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슈로 밀리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최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질문이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을 뒤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력 공백 상태가 근거로 제시됐다.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정권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보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 다음에 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개혁안의 큰 틀, 방향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다소 원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는 핵심을 짚었다고 받아들였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개혁 방식이 정권·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 왔음을 상기하는 발언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전 정부와 그 이전 정부 모두 비급여 관리 강화안을 내놨다. 직전 정부에서 도입한 예비급여는 적용 질환의 제한 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을 50%, 70%, 90% 등으로 다양화했다.
그 이전 정부가 추진한 선별급여는 비용 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던 항목을 80%, 90%로 본인부담금을 높였다. 색깔은 다를지 몰라도 비급여를 통제해 의료비 오남용을 잡겠다는 방향성은 같았던 셈이다.
이처럼 정치와 실손보험 개혁은 별개로 이뤄져 왔으며, 앞으로도 별개여야 한다. 보험 정책이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뒤집힌다면 결국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만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개혁안이 밀리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하니 요즘은 정치 기사도 확인하게 된다"며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 보험설계사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개혁안 내용 설명을 넘어 정치 현안에 대한 해석을 묻기도 한다"며 "실손 개혁을 추진하는 와중에 탄핵 같은 이슈가 터진 것은 처음이라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어느 보험이든 제1목적은 소비자 보호다. 더군다나 실손보험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보험'이기에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물론 개혁안이 정부가 내놓은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부분들은 반영돼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이 그 목적을 이루도록, 소비자 불안만 가중시키는 정치권 개입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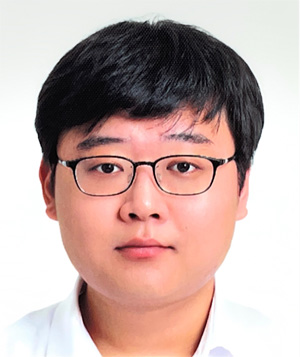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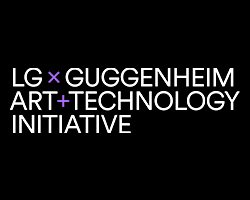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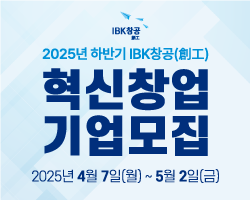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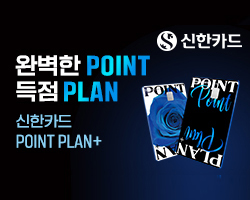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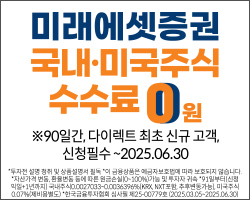


![[포토] 1년 만에 재개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417/art_684642_1745195174_245x1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