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로 20억짜리 집 산 24세…"편법 증여 조사해야"
가족·지인에 빌린 돈으로 집 구입 8월 기준 4224건…작년보다 144%↑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9.23 16:24:07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 이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보다 144% 증가했다.
통상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는 게 소 의원 측 설명이다.
소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이들이 적정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지, 또 적정 이자율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을 살펴보면 △5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 △30억~50억원 18건 △20억~30억원 37건 △10억~20억원 281건 등이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산 이들이 은행에서 30년 만기·연이율 2.70%·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기준으로 대출 받았다면 50억원을 빌린 사람은 매월 2028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30억원을 빌린 사람은 매월 1217만원, 10억원을 빌린 사람은 406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의 한 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산 1997년생 A씨는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차지하는 17억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 만약 A씨가 어머니가 아닌 은행에서 30년 만기·연이율 2.70%·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빌렸다면 그는 매월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증여받는 경우 총 5억1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며 "이는 5억1992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부모찬스'로 편법증여…국세청, 85명 세무조사 착수 (2020/11/17)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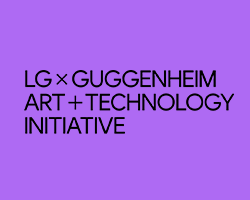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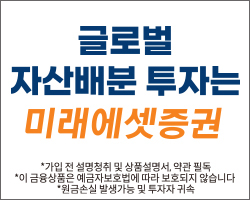










![[포토] 홈쇼핑업계, AI컨택센터 기반 주문·상담 자동화 가속](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9/art_696835_1752857291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