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中 의존도 줄인다 "이제는 소재 경쟁"
K배터리 중국산 소재 높은 의존도…자체 수급으로 원가절감+경쟁력 강화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5.26 17:12:22

포스코케미칼 세종 음극재 공장 생산라인. ⓒ 포스코케미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맞춰 배터리 소재 사업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K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2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수요는 지난해 310만대에서 2030년 5180만대로 17배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139GWh에서 3254GWh로 23배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증가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도 공장을 증설하는 등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다. 2030년 기준으로 중국 CATL은 생산능력을 990GWh까지 늘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815GWh의 배터리 생산량을 확보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는 각각 배터리 생산량 344GWh, 254GWh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점유율 1위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방대한 내수시장을 등에 업고 빠르게 점유율을 늘렸고, 그 결과 올해 초 국내 기업을 추월했다.
전기차 배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중국의 공세로 밀리는 상황인 것. K배터리 경쟁력을 위해선 핵심 소재 내재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전기차 최대 시장일 뿐만 아니라 K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대부분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기술력 부분에서는 앞서 있지만 소재 부분에서는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배터리 핵심 소재를 무기로 삼고 있어 중국 전략에 따라 K배터리는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핵심 소재를 자체 조달하면 배터리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원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 소재 시장 점유율은 양극재 57.8%, 음극재 66.4%, 분리막 54.6%, 전해질 71.7%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배터리 소재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자체 생산을 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면서 "배터리 소재부터 생산까지 전체적인 투자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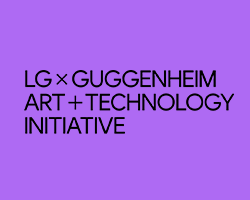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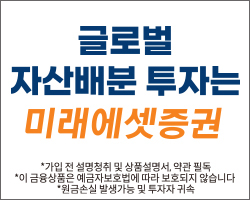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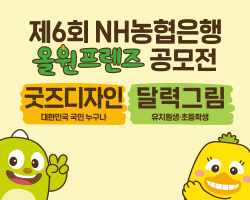




![[포토] 홈쇼핑업계, AI컨택센터 기반 주문·상담 자동화 가속](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729/art_696835_1752857291_245x1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