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따로 없다. 최근 현대차에 각종 악재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판매량 감소에 따른 부진한 실적부터 노조파업, 검찰고발, 차량결함, 울산공장 침수 등 다양한 시련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의 잇단 파업이 현대차의 골머리를 앓게 한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통해 노조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총 24번 진행된 파업 탓에 14만2000여대의 차량이 생산되지 못했고, 3조10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의 손실도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현대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향후 파업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조합원 내부에서도 파업 찬반을 놓고 엇갈렸다. 파업의 명분이 없는 데다 대내외적으로 파업을 이어가기에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서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차 노사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자 고용노동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화에 접어든 노조의 파업이 국민경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협력업체와 중소기업계는 참다못해 '현대차 불매운동'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현대차 노조 임금이 중소기업보다 2배 혹은 그 이상 높은데도 노조가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을 하다 보니 공감을 얻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즉, 완성차업계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임금인상분이 고스란히 협력업체에 전가되는 부조리의 악순환에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업계는 글로벌 경쟁력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중심에는 항상 현대차 노조가 있었다.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대차 노조의 평균임금은 독일, 일본 브랜드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생산성은 그들보다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조는 매년 파업을 무기로 해마다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해왔다.
이외에도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국내 및 해외공장 총 생산량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경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올해는 '승진거부권'이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물론, 노조의 이런 요구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고용불안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영역 밖의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 보신주의(保身主義)로도 비친다.
'안티 현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차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 중 하나다. 만약 국내 노동현장에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악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가경제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는 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자신들의 행보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노조의 행동에 상당수 국민들은 시선을 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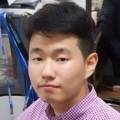
협력업체와 국민들, 정부마저 등을 돌리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동시에 사측을 견제하며 회사를 성장 및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눈앞에 닥친 다양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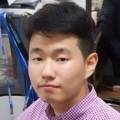 협력업체와 국민들, 정부마저 등을 돌리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동시에 사측을 견제하며 회사를 성장 및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눈앞에 닥친 다양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협력업체와 국민들, 정부마저 등을 돌리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도 있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동시에 사측을 견제하며 회사를 성장 및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눈앞에 닥친 다양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