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지난달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관련 토지 소유주가 관리상 이유로 본인 땅에 담장을 둘러치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분쟁은 탑골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동쪽 경계에 A씨의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A씨의 땅은 공원 터 일부지만 실제 공원 경계로 쓰이는 담장 바깥이었다. 이에 A씨는 이 땅을 사들여달라고 종로구청에 요청했고, 구청도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원 부족 때문에 무산됐다.
보행로 및 개인 유료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던 A씨는 노숙·쓰레기 투척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문화재청에 자신의 땅 경계에 높이 1.8m 담장과 2개 대문 설치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역사·문화적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고, 재판부도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고 해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있다면 이를 제한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시 복천동 고분군 인근도 재산권 문제로 시끄럽다. 유적지 근처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하겠다는 주민 협동조합원들의 요구를 문화재청에서 6차례나 부결시켰기 때문. 부산시 문화재 유적지의 심장부인만큼, 최대 29층까지 올라가는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행정 측에서 진행하는 문화재 유적 관련 손질에 대해 주민들이 "문화재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순천 낙안읍성을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행정관리사무소가 진행하는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문화재 풍광과 역사를 훼손하는 전시행정이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문화재청과 주민들 간 줄다리기에서 중점이 되는 사안은 문화재 근처 또는 바로 옆, 심지어 문화재 유적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주민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문화재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민이 개발을 원하고 당국에서 이를 막는 상황이든, 반대로 당국의 적극적 관리 행보에 주민이 '보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든 짚어볼 부분은 문화재청을 위시한 행정기관의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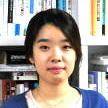 아무리 당연한 행정적 절차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해도 주민들의 민원을 '흠집내기식'이라거나 '대응 가치가 없다'는 말로 무시해 버리는 태도는 옳지 않다. 주민들에게 그곳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법의 영역에서만 가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당연한 행정적 절차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해도 주민들의 민원을 '흠집내기식'이라거나 '대응 가치가 없다'는 말로 무시해 버리는 태도는 옳지 않다. 주민들에게 그곳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법의 영역에서만 가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