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현재 구입 가능한 번역본으로는 까치글방(김명자 번역) 출판본이 유일한 것 같은데 과학도나 과학자라면 원본이 나을 거고, 일반인이라면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요약만 파악하거나, 다른 사람의 해석서를 읽을 것을 권한다. 필자 무지의 소치라고 몰아 부치면 할 말 없지만 번역자 말대로 철저한 직역을 해서인지 과학과 거리가 있는 일반인이 읽기에는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짜증나게 어렵다. 비전문가에 대한 서비스, 제2의 창작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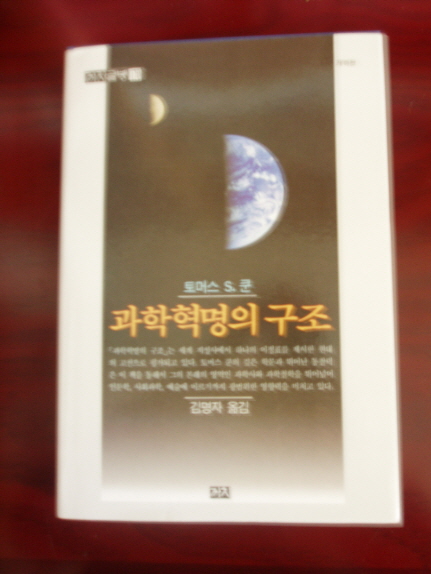 |
||
| OLYMPUS DIGITAL CAMERA | ||
산등성이의 햇빛이 일진광풍에 휘날리면서 어두운 골짜기가 순간 조명탄이 터진 것처럼 환해진다. 빛이 입자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빛이 파동이라면 방파제가 물결을 막듯이 유리창도 빛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진공관 안의 바람개비에 빛을 쏘이면 바람개비가 움직인단다. 이건 도대체 입자도 파동도 뭣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 빛은 입자와 파동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양자역학적 실체, 빛 자체, 광자라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의 중론이다. 물론 중론일 뿐이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언제든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광자’라는 중론,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 이론에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 석유곤로에 조그만 불이 붙었다. 얼른 심지를 내리고 입으로 바람을 세차게 불었지만 꺼지긴커녕 더 번질 기세다. 순간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올랐다. 기름에 불 붙었을 때 물 끼얹으면 큰일난다. 이불을 덮어라. 그래서 두꺼운 이불로 곤로를 겹겹이 덮었다. 다행이 불이 꺼졌다. 이불이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는 과학적 사실 정도는 교과서로 배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1743-1794) 이전에는 산소가 아닌 플로지스톤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과학자가 아닌 필자에게 빛의 성질이 무엇이든, 산소가 결합해야 연소가 일어나든, 그런 과학적 사실을 알고 모르고가 크게 중요치 않다. 해가 지면 어둡고, 스위치 올리면 전등이 켜지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안전하다는 정도만 알면 세상 사는데 크게 불편할 것이 없을뿐더러 그런 것들은 스스로의 경험이나 사회적 훈련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와 문법도 모르면서 소설을 쓸 수 없듯이 과학을 업으로 삼겠다는 과학도라면 다르다. 토머스S.쿤(Thomas S. Khun)이 1962년에 초판을 낸 ‘과학혁명의 구조’는 바로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책으로 보인다. 과학은 어떤 경로로 발전하는지, 그러므로 공부와 연구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를 제시한 현대 과학관의 ‘고전’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는, 그 유명한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이란 말도 이 책이 원조다.
쿤에 따르면 과학적 진보는 지식의 축적에 따라 귀납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과 양립 불가한 새로운 이론의 출현으로 과학적 패러다임의 부분적 전환, 또는 대이동의 혁명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패러다임이란 어느 과학분야의 기본이론, 시각, 법칙, 개념, 지식은 물론 과학도들의 교과서와 문제풀이집, 실험장비와 기술, 관습, 관행까지 ‘어떤 과학의 모든 것’이다. 가장 극적인 실례가 1543년까지 지구를 돌던 태양이 갈릴레오, 케플러를 거쳐 뉴턴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지구가 태양을 돌게 되는 2백 년에 걸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과정이다.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일한 패러다임 아래서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는 <정상과학의 시기>에 어느 정상과학의 이론이나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현상의 출현이 빈번해지고, 그러한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이론과 충돌, 경쟁하는 <위기의 시기>를 거쳐 기존의 이론은 붕괴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상과학>으로 등극한다.
특히 이 과정에 대해 쿤은 과학적 활동 역시 인간의 여타 사회적, 정치적 활동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간파한다. 통상적으로 과학의 특성이라고 간주되었던 객관성, 논리성, 경험주의, 가치중립적 성격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지언정 각자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자기중심적 합종연횡이나 개종, 커밍아웃 등에 따른 최후의 결과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여기서 쿤의 생각은 과학도나 과학자에겐 정상과학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렴적 사고와 함께 의문과 대안을 편견 없이 탐구하는 열린 마음의 발산적 사고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과학적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흑사병을 피해 시골의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던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불현듯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 냈다는 것은 웃자고나 하는 말이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당시까지 지배적이던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체계는 물론 갈릴레오, 데카르트, 케플러, 보일, 가쌍디, 홉스, 유클리드, 헨리모어까지 기하학, 근대역학, 화학, 천문학, 기계적 철학, 광학 등 당시의 정상과학과 뉴 패러다임들을 두루두루 섭렵한 결과였다. <정상과학>없이는 <뉴튼, 아인슈타인의 출현>도 불가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책이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과학과 정치의 발전적 혁명 구조가 심오하리만큼 원천적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기존 정치제도, 법, 관행에의 개혁적 저항, 진영의 양극화, 정치의 실종, 무력과 대중설득 등 정치외적 사건으로서의 혁명, 새로운 정치>가 그렇다. 기존의 정치체제에서 일어나는 합의불가한 이상현상의 누적, 이상현상을 관통하는 새로운 제도와 합의가 바로 정치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금도 부분적 이상현상들에 의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할 능력이 안되거든 최소한 전환되는 패러다임을 읽고, 열심히 쫓아라도 가주는 것이 정치적 생존의 관건이라는 것이 이 책으로 배우는 점이다.[참고서적 : 창비사/홍성욱•이상욱 외 지음/뉴턴과 아인슈타인, 우리가 몰랐던 천재들의 창조성/2004]
 |
||
컬럼니스트 최보기 thebex@hanmail.net